기획특집
| [국민대웹진unik-헬로우월드]끝없는 매력 간직한 지구촌 대표 도시 런던 | |||||||||||||||||||
|---|---|---|---|---|---|---|---|---|---|---|---|---|---|---|---|---|---|---|---|
 런던의 모든 것을 ‘독파’하겠다는 호기로움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장소와 아이템을 추린 다음, 효과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런던 여행에도 ‘기본 메뉴’가 존재한다. 런던을 대표하는 아이콘들을 일별하는 것이다.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식이 거행된 곳으로 유명한 세인트폴 대성당(Saint Paul’s Cathedral),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하이드파크(Hyde Park), 영국을 빛낸 명사들이 잠들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 여왕의 위엄을 대변하는 버킹엄 궁전(Buckingham Palace) 등을 ‘1차 목록’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런던에 머물며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템스(Thames)강이다. 한강이 서울의 얼굴이고, 차오프라야 강이 방콕의 젖줄이며, 나일 강이 카이로의 자궁이듯이 런던은 템스강에 많은 것을 의탁하고 있다. 볼거리만 따져도 런던의 랜드마크인 타워브리지(Tower Bridge)가 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House of Parliament)과 빅벤(Big Ben)도 템스강과 빈틈없는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강변을 장식하고 있는 회전 관람차 런던 아이(London Eye)는 영국의 21세기 심벌로 대접받고 있다.  런던 여행의 기초 과정을 끝냈다면 자신의 테마에 맞춰 ‘심화 학습’에 나서면 된다.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준수한 대안이 될 만하다. 뉴욕, 베를린과 더불어 ‘세계 문화의 심장’으로 군림하는 곳이 다름 아닌 런던이기 때문이다. 런던 컬처 트래블의 핵심은 박물관과 갤러리다. 아무리 일정이 촉박해도 건너뛸 수 없는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은 박물관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자국의 보물을 필두로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의 유물들을 함께 소장하고 있다. 전시 품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박물관을 꼼꼼하게 둘러보려면 하루 해가 짧기만 하다. 한국관도 한 쪽에 마련돼 있다. 현대 미술의 정화를 모아 놓은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Modern Gallery)는 쓸모를 잃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다. 지금도 99미터 높이의 굴뚝이 건물 한가운데에 상징처럼 솟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별히 사랑 받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영국의 장점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면 데이트 모던으로 데려가라.”고 일갈했을 정도로 영국의 모던함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곳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테이트 모던은 대영박물관과 마찬가지로 특별 전시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 앞의 보행자 전용 다리인 밀레니엄 브리지(Millenium Bridge)를 건너면 런던의 또 다른 명소인 세인트폴 대성당과 마주할 수 있다.  런던 시티 투어의 시발점인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을 내려다보고 있는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은 대영박물관, 테이트 모던과 더불어 영국의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13세기 중반부터 1900년에 이르기까지 고흐와 모네를 비롯한 유럽 작가들의 작품 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내셔널 갤러리 옆에는 영국의 위인들이나 왕족들의 초상화 및 사진을 전시한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이 있다. ‘3대 미술관’에 비해 인지도는 다소 낮지만 인상파의 개척자인 마네를 비롯해 고흐, 고갱, 세잔,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파 거장들의 걸작들이 즐비한 코톨드 인스티튜트 갤러리(Courtauld Institute Gallery)도 놓치기 아까운 곳이다. 그 유명한 <귀에 붕대를 감은 고흐의 자화상>을 실제로 만나볼 수가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템스강 북쪽, 레스터 스퀘어(Leicester Square)와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웨스트엔드(West End) 지역은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의 뮤지컬 시장을 양분하는 곳이다.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 전 세계를 감동시킨 4대 뮤지컬이 모두 이곳에서 탄생했다. 웨스트엔드에만 수십 개의 뮤지컬 전용 극장이 있으며, 연중 100여 개 이상의 공연이 쉴 새 없이 펼쳐진다. 해마다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수조 원에 이르는 티켓 매출과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무려 58년째 공연되고 있는 <마우스 트랩>을 비롯해 <맘마미아>, <빌리 엘리어트>, <시카고> 등도 장기 공연을 거듭하고 있다. 웨스트엔드의 성공 신화는 전설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런던의 활기를 만끽하고 다채로운 속살을 엿보고 싶다면 재래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 탐험이야말로 런던 여행의 알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버킹엄 궁전의 위병 교대식보다 박진감이 넘치고, 대영박물관에 버금가는 다국적 문화를 체감할 수 있으며, 유명 백화점의 대명사격인 해러즈(Harrods)보다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다른 명소들을 뒤로하고 ‘마켓 투어’로만 런던 일정을 짜도 며칠은 너끈히 소요된다. 캠든 마켓(Camden Market)은 가장 요란한 시장이다. 상점들마다 걸려 있는 물건들이 각양각색이고, 상점의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도 개성 만점이며, 상점들을 헤집고 다니는 젊은이들의 차림새는 현란하고 심지어 기괴하기까지 하다. 타투와 피어싱 숍은 물론이고 검은색 일색의 고스족 의상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곳의 분위기를 여실히 말해준다. 캠든 마켓에서는 그 어떤 문화와 주의와 개성도 배척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국적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점도 캠든 마켓이 간직한 매력 중 하나다. 영화 <노팅힐>에도 등장하는 포토벨로 마켓(Portobello Market)은 언제나 사람들로 들끓는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각종 골동품에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의 패션 소품과 생활 잡기들까지 온갖 물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 길거리 공연으로 유명한 코벤트 가든에도 애플(Apple)과 주빌리(Jubilee) 등 2개의 마켓이 있다. 일정상 주말 시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으면 된다.  브릭 레인(Brick Lane)에는 빈티지 숍이 유독 많다. 눈썰미만 좋으면 보석 같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런더너들의 앞선 패션 감각을 엿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이곳에서 일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에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총 집결한다. 중고 카메라와 헌책 등은 물론이고 ‘이런 걸 과연 누가 사갈까’ 싶을 정도로 소소한 물품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 브릭 레인 인근의 스피탈필즈 마켓(Spitalfields Market)은 주로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을 팔던 곳으로 주변에는 작고 이국적인 카페들이 포진해 있다.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인 버러 마켓(Borough Market)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된 경우다. 이들이 직접 재배하고 기른 야채, 과일, 생선, 고기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장을 보거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런던 주민들이 자주 찾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홋홋한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한 줄로 꿰어져 돌아가는 소시지 꼬치구이와, 굽는 소리가 매혹적인 두툼한 스테이크가 침샘을 연신 자극한다.  런던이 더욱 탐스러운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시선을 돌리면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런던이 줄줄이 마중 나온다는 점이다. 그 중 한 곳이 런던 북쪽의 햄스테드 히스(Hampstead Heath)로, 옛날부터 다수의 귀족들이 거주하던 부촌이다. 햄스테드 역 주변에 담상담상 모여 있는 단층 건물과 주택가를 지나면 드넓은 목초지가 나오는데, 런던 시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롭고 푸근한 정경에 마음의 무장해제가 절로 이뤄진다. 폐부 깊숙이 녹색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20분 가량 걷다 보면 기품 있는 외관을 갖춘 미술관 켄우드 하우스(Kenwood House)가 모습을 드러낸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전시돼 있는 건물 내부도 눈길을 끌지만 널찍한 공원과 벗하는 미술관 풍경은 영화 <노팅힐>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전한다. 켄우드 하우스는 영국의 법정 자문 기구로 문화유산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는 잉글리시 헤리티지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방점을 찍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정부 버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보존을 위한 아름다운 숨결이 느껴지는 건물 앞 공원에서는 여름이면 야외 음악회가 열려 절정의 낭만을 선사한다.  런던 동쪽에 자리를 틀고 있는 쇼디치(Shoreditch)는 문인, 화가, 디자이너, 사진가, 평론가 등 이른바 ‘런던 예술가’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사실 런던에 이민 온 인도 사람이나 아랍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지역이었다. 도심에 비해 땅값과 건물 임대료가 헐했기 때문이다. 런던 심장부에 위치한 작업 공간의 높은 임대료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술가와 전문직 종사들도 매한가지. 결국 그들도 쇼디치로 이동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곳 빌딩들의 상당 부분은 출판사나 스튜디오, 화가의 작업실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일터와 더불어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잠시 쉬어갈 공간으로 카페나 바를 찾는다. 한 잔의 맥주를 기울이며 서로의 일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는 것이다. 쇼디치의 카페나 펍들은 한곳에 모여 있다기보다 곳곳에 산재하는데, 작은 간판 하나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넓은 규모에 놀라게 된다. 뒷골목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살린 곳도 있고, 우아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감각의 집기로 멋을 부린 경우도 많다. 어느 곳을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쇼디치 사람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잘 알려진 관광지만큼 덜 알려진 명소도 풍부한 런던은 단 2~3일 만에 매력을 독파하기 힘들 만큼 눈앞을 막아서는 볼거리와 문화적 자산이 풍성하다. 정치, 경제, 문화를 막론하고 지구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막강하며 미치는 파급력도 대단한 런던. 길게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도시다. 당신이 다음 방학 때 런던 여행을 꿈꾼다면 부디 긴 시간을 할애해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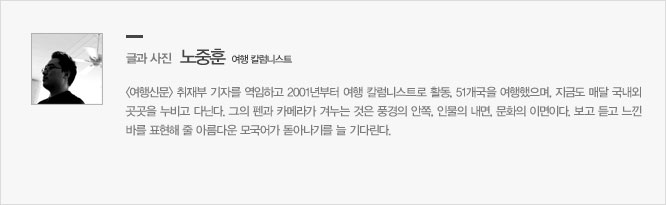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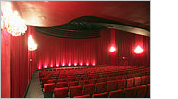




 웹진 :
웹진 : 
















